1. 적자생존이란??
먼저,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은 한자로 ‘적절할 적(適) + 놈 자(者) + 날 생(生) + 있을 존(存)’이 모여서 만들어진 말이야.
즉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지.
원래 과학, 특히 생물학 쪽에서 쓰이던 용어였고, 이후 사회나 경제 쪽에 비유적으로 차용된 거야.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기본 배경에 있고, 허버트 스펜서가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을 먼저 썼다는 기록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이 흔히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원래는 “환경 조건에 ‘적합한’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지. 즉, 무조건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는 능력이나 특징을 갖춘 존재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이 건조한 환경에 더 잘 견디는 특징을 지녔다면 그 식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지? 또 사회적으로는 변화 속도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개념이 단순히 강약 논리로 쓰이면 위험해질 수 있어. 왜냐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프레임이 “약한 자는 도태되어도 당연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야. 실제로 여러 글들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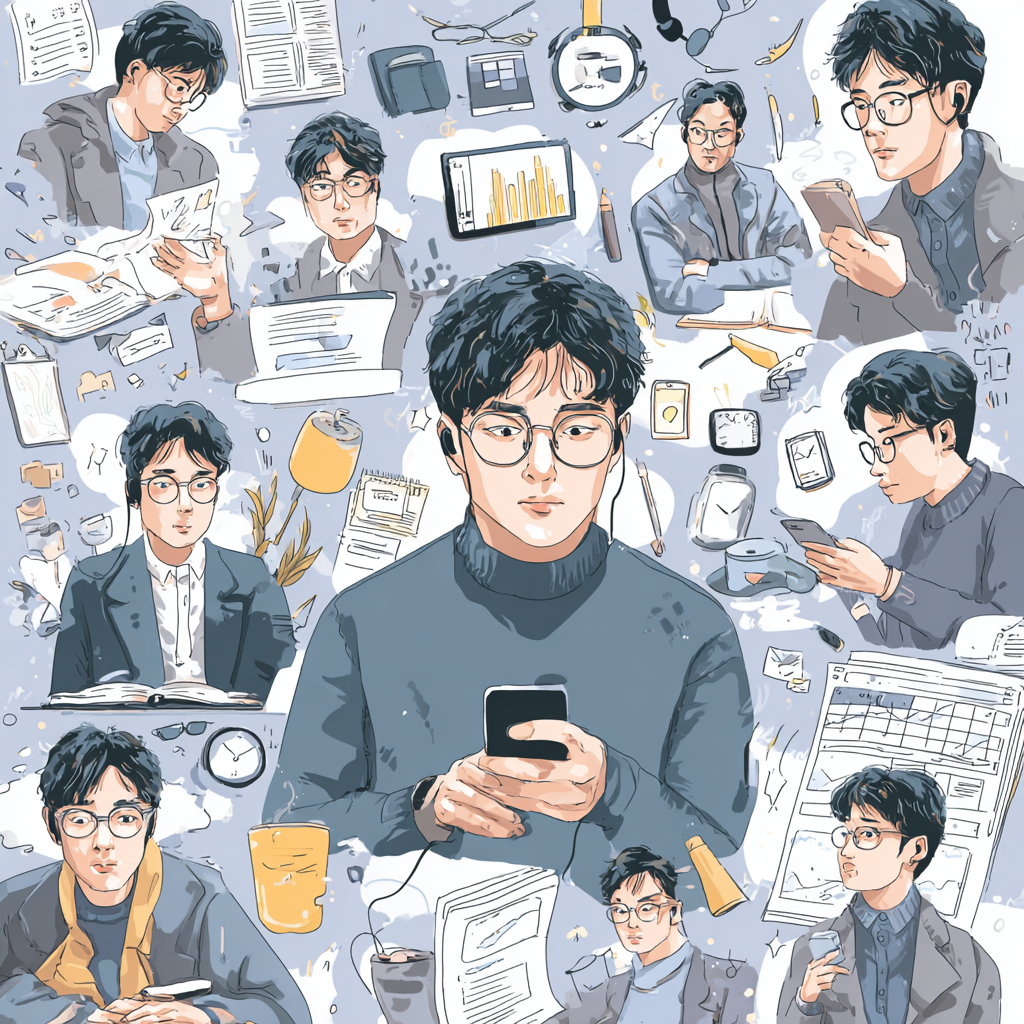
2. “적자생존”에 얽힌 이야기들 : 다른 블로그들에서 본 감상
적자생존에 대해 인터넷 글들을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적자생존”을 참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어.
- 어떤 사람은 “적자생존 =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을 재치 있게 바꿔 쓰더라. 기록하고 글 쓰고 남기는 사람이 결국 기억되고 영향력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 Brunch Story+1
- 또 어떤 글에선 “적자생존은 약육강식과는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고, “단순히 힘이 센 게 유리한 건 아니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특히 인간 사회에 이 개념을 그대로 들이대면 문제생긴다고. Brunch Story+2Brunch Story+2
- 글쓰기나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자생존, 글 쓰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문구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블로그나 콘텐츠 시대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지. Brunch Story+1
- 또 어떤 블로그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기억은 흐르고, 잊히고, 남는 것은 글이나 기록이라는 거야. Brunch Story+1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들은 이 ‘적자생존’이라는 오래된 말을 단지 과학적 원리로만 보지 않고, 삶의 태도나 가치관으로 끌어다 쓰고 싶어 한다는 거야. 강함이 아니라 적합성, 기록이 생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재해석되는 거지.
3. 이 시대와 앞으로의 길을 표현하는 현대어식 사자성어 하나 제안할게
요즘 감성으로 하나 만들어본다면…
“지속성장(持續成長)”
- “지속”이라는 말엔 멈추지 않고 이어간다는 뜻이 있고, “성장”은 변하고 나아간다, 발전한다는 뜻이니까.
-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까 한 순간의 성공이나 우월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가 결국 살아남는 쪽 아닐까.
- 즉,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바뀌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존재가 앞으로의 길인 것 같아.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하자면:
“융합생존(融合生存)”
-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요즘 세상엔 단독으로 강한 것보다 융합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
- 기술이랑 인간이랑 예술이랑 비즈니스가 뒤섞이고, 여러 분야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니까.
- 그래서 나는 “융합생존”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 — “맞는 자만 살아남는다”보다 “섞이고 적응할 줄 아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느낌이니까.